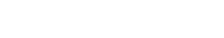- 기자명 김형진 뉴질랜드 칼럼니스트
- 글로벌
- 입력 2024.03.12 16:25
- 수정 2024.03.18 11:04
뉴질랜드 키위의 전설과 안타까운 위기
[김형진의 걸쭉한 뉴질랜드 이야기]
뉴질랜드에 있는 세 종류의 '키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맹한 '키위'
천적 없이 살아온 키위와 카오리의 '위기'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존에 도움 '교훈'
키위 농장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쥬'
몇 년 전에 Te Awamutu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 때,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맙게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종의 재능 기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원봉사 선생님들 중에 Bill Yarndley라는 연세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의 짧았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항상 다 찌그러진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고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항상 흙 아니면 기계기름이 묻어있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대에서 제일 큰 키위 농장을 운영하는 대지주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그 농장의 일부를 산책로가 있는 멋진 숲으로 조성해 기부하셨고, 시에서는 그곳에 Yarndley’s Bush라는 이름을 붙여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분이 더더욱 고마운 건 연말이 되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를 열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파티가 끝난 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본인의 농장에서 수확한 키위를 몇 박스씩 나눠주셨습니다. 그 후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선생님도 농장을 정리하고 Taranaki라는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지금도 마트에 진열된 키위를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한마디로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를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Bill 선생님께서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세 종류의 '키위'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뉴질랜드에는 3가지 키위(Kiwi)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과일' 키위입니다. 다른 키위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Kiwi Fruit라고 부릅니다. 원산지는 중국 남부지방이지만 뉴질랜드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콤한 골든 키위(Golden Kiwi Fruit)와 새콤한 그린키위(Green Kiwi Fruit)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골든 키위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마트나 과일가게에서 접하기 쉬운 과일이지만 뉴질랜드의 초여름인 11월, 12월 경에 이곳을 오시면 바로 수확한 신선한 키위를 저렴한 가격에 맘껏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위는 '사람' 키위입니다. 영국의 반강제적인 초대(?)로 호주와 함께 ANZAC (Aust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라는 부대를 만들어 1,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 뉴질랜드 군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군인들 중 특히 마오리들의 용맹함이 돋보였다고 하는데, 6.25전쟁 때 파병되어 우리나라에 머물었던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전통민요 ‘Pokarekare Ana’라는 노래가 나중에 우리말로 번안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닷가에 모닥불 피워놓고 통기타 치며 부르던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잠잠해져 오면...” 으로 시작되는 ‘연가’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지금은 New Zealander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못봤고, Kiwi가 뉴질랜드 사람을 칭하는 거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마오리와 구분하여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백인들을 부를 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저 같은 동양인이나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을 키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키위 새'입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의 국조(國鳥)로 고사리(Silver Fern)과 함께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날개가 작게 있지만 날지는 못하고 주로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체구에 비해 긴 부리를 이용해서 땅에 사는 지렁이, 곤충 등을 먹고 삽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어떻게 이렇게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오리나 유럽인들이 이 곳에 오기 전까지는 뉴질랜드엔 포유동물이 살고 있지 않아서 굳이 날지 않아도 천적의 괴롭힘이 없었기에 날개가 퇴화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퍼뜨린 쥐, 개, 고양이 그리고 포섬(Possum, 주머니쥐 비슷한 야생동물. 국가적으로 해로운 동물로 지정)등의 육식동물들이 키위새들의 알을 모두 먹어 치우는 바람에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위새는 1년에 딱 한 번 알을 낳는 데다가, 체구에 비해 알이 너무 커서 산란하다가 죽는 암컷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탓에 번식력이 매우 낮아서 안타깝게도 매년 그 개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키위새 말고도 고대 뉴질랜드에는 모아(Moa)라는 아주 큰 조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타조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날지 못하고 뛰어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키가 무려 3m가 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였다고 합니다. 날지 못하고 덩치가 크니 훗날 이 땅에 도착한 마오리들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겠죠. 마오리들이 오기 전까지는 하스트 독수리(Haast’s Eagle)라는 큰 맹금류가 이 모아새의 유일한 천적이었는데, 마오리들이 모아새를 모두 다 잡아먹는 바람에 멸종되어 버리고, 따라서 먹이가 없어진 하스트 독수리들도 때아닌 날벼락을 맞아 다들 따라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위 중에 어떤 키위가 그 이름에 대한 오리지날리티(원조)를 가지고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번째인 '사람' 키위는 절대로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 두 번째 키위들은 대체로 낙천적이고 친절합니다. 서울 인구 절반이 조금 넘는 인구수 정도의 사람들이 한반도보다 큰 땅에 흩어져 사니 아무래도 느긋한 성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저녁이 되면 발코니에 나와 앉아서 식사와 함께 와인을 한잔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고, 주말이면 차 뒤에 요트를 매달거나 자전거를 싣고 떠나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산행을 즐기는 편이라 시간이 날 때마다 물병 하나 들고 여기저기 트레킹을 많이 다닙니다. 사실 산은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 훨씬 예쁘고 정겹지만, 여기는 한국에 비해 등산객이 그리 많지 않아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어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입산 통제가 된 구역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고사병(枯死病, Dieback)전염으로부터 카우리(Kauri) 숲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키위새와 카우리 숲의 '슬픈 교훈'
카우리는 뉴질랜드 북섬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토종 식물로, 조금 남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뿌리 내리면 천년을 넘게 사는 나무로, 내부 경쟁이 치열한 숲속에서 다른 나무들보다 빨리 자라기 위해 스스로 곁가지를 잘라내면서 쭉 뻗어 자라다가 결국 햇빛을 확보하게 되면 비로소 가지를 펼쳐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제일 높은 부위에만 가지가 있고 중간에는 곁가지가 없는 기둥과 같은 형태라 아주 좋은 목재가 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외딴 섬나라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위새나 모아새들이 외부에서 도입된 천적에 취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인간들이 달고 온 외래 식물이나 병균 등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뉴질랜드가 고립되어 있을 때는 몇천년을 살아왔던 카우리도 외래종인 고사병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 안타깝게도 많은 고목들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키위새나 모아새, 그리고 카우리 나무의 예에서 보듯이, 독립되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그 당시에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누리면서 즐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나약해져서 불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아주 오랜 시간 다른 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이겨낸 끝에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날카로움이 무뎌지게 되고 결국 안타깝게도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더 강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는 고마운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는 확실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글을 쓰는 김형진 님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버스 운전 하고 있는 꼰대심 투철한 대한의 '아재'입니다. 제가 이 곳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